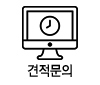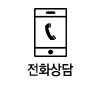바다이야기7 ㎟ 사이다 릴게임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바다이야기7 ㎟ 사이다 릴게임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관련링크
-
 http://79.rhf865.top
0회 연결
http://79.rhf865.top
0회 연결
-
 http://52.rak136.top
0회 연결
http://52.rak136.top
0회 연결
본문
릴게임먹튀검증 ㎟ 야마토게임동영상 ㎟㎩ 0.rmk359.top ㎙미생물을 키울 때 쓰는 페트리 접시에 대장균을 배양한 모습. 대장균은 흔한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하나로 원래 1차 항생제로 간단히 치료되지만 항생제 남용 등으로 내성균이 등장하면서 치료가 복잡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 슈퍼박테리아(여러 항생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 경계령을 발령했다. WHO는 10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항생제 내성(AR)' 보고서에서 필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급속도로 증가해 전 세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통상 쓰는 약물로 퇴치가 어려운 세균을 '퍼 박테리아'로 부르며 경계한다.
보고서바다이야기 온라인
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흔한 박테리아(세균) 감염질환 6건 중 하나가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서 2023년에 걸쳐 분석된 항생제-박테리아 조합에서 내성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
바다이야기게임다운
한국의 항생제 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DID(DDD/1000 inhabitants/day)는 주민 1000명당 하루 사용 의약품 양을 DDD(Defined Daily Dose: 일일 상레드오션투자클럽
용량)로 환산한 수치다. 31,8 DID는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는 2022년 25.7 DID로 상위 4번째에 올랐던 것보다 더 심각해진 수치다. 2022년 한국의 DID는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해 회원국 중 대표적인 항생제 남용 국가로 꼽혔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카지노릴게임
되면 약물 선택이 제한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증증환자와 노령환자, 어린이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생제 남용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 과제로 꼽힌다. 내성균의 증가는 입원 기간을 늘리고 고가 항생제 사용으로 의료비를 늘려 보건경제학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동남아와 동지중해에선 관련 감염 3건재테크동호회
중 1건이 내성균 때문
2300만 건 이상의 감염질환 사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아시네토박터속균, 대장균, 폐렴막대균, 임균성 임질균,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속균, 시겔라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연쇄상구균 등 8가지 흔한 병원성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삼았다. WHO는 이 8종의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요로·혈류·위장관·비뇨생식기·임질 감염 등에 처방되는 22가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병률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은 WHO가 100개국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감시 시스템(GLASS)'에 보고된 데이터가 바탕이 됐다.
WHO는 항생제 내성 위험이 동남아시아와 동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보고된 감염 사례 3건 중 1건이 내성균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아프리카 지역에선 감염 사례 5건 중 1건이 내성균에 의한 것이었다.
중증환자 공격 그람음성균 1차항생제에 40~70% 내성
더욱 문제는 살모넬라균·이질균·티푸스균·대장균·콜레라균 등 그람음성균이다. 그람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증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과 요로 감염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료 시설·장비·인력 등의 부족으로 세균성 병원균 진단·치료 역량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그람음성균 때문에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람음성균 중 대장균과 폐렴간균은 약제 내성 그람음성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패혈증·장기부전,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세균 감염인 혈류 감염에서 발견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장균의 40% 이상과 폐렴간균의 55% 이상이 이러한 감염증의 1차 치료제인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에선 이에 대한 내성률이 70% 이상이라고 WHO는 지적했다.
1차는 물론 2차 항생제에서도 40~50% 내성
병실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와 이를 보살피는 의료진의 모습. 중증환자의 인공호흡기와 요로 등에는 그람음성균이 감염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이 위험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흔한 질환에 쓰는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의 유전자가 확산되면, 관련 감염질환을 잃는 환자에겐 더 비싸고 더 구하기 힘든 2차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2차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 때나 1차 항생제가 듣지 않을 때 쓰는 2차 광범위 항생제인 '감시(Watch) 항생제'의 내성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선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에 의한 혈류 감염의 최고 54.3%가 감시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보였다. 이 항생제는 1차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면서 사용이 늘고 있는 2차 항생제다. 동남아시아에선 폐렴간균에 의한 혈류 감염에서 카바페넴의 내성 빈도가 4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 확산 속도,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빨라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를 앞지르며 전 세계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국이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를 강화해 항생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WHO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새 감염질환 확산이 신약 개발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몽유병 환자처럼 세계적 보건재앙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2050년까지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젠 새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대중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적절한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항생제는 약 90종이지만 다제내성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항생제는 단 5종에 불과하다.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시스템 GLASS는?
WHO에 이번 보고서 작성에 토대가 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감시 시스템(GLASS: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Use Surveillance System)'은 2016년 25개국으로 시작해 2016년 104개국까지 늘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항균제 감수성 검사(AST)'를 실시하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면서 GLASS를 통해 WHO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GLASS에 참여한 국가가 104개국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제내성균 대응에서 국가별 불평등이 상당한 셈이다.
채인택 의학 저널리스트 (tzschaeit@kormedi.com)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 슈퍼박테리아(여러 항생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 경계령을 발령했다. WHO는 10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항생제 내성(AR)' 보고서에서 필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급속도로 증가해 전 세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통상 쓰는 약물로 퇴치가 어려운 세균을 '퍼 박테리아'로 부르며 경계한다.
보고서바다이야기 온라인
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흔한 박테리아(세균) 감염질환 6건 중 하나가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서 2023년에 걸쳐 분석된 항생제-박테리아 조합에서 내성이 40%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
바다이야기게임다운
한국의 항생제 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DID(DDD/1000 inhabitants/day)는 주민 1000명당 하루 사용 의약품 양을 DDD(Defined Daily Dose: 일일 상레드오션투자클럽
용량)로 환산한 수치다. 31,8 DID는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는 2022년 25.7 DID로 상위 4번째에 올랐던 것보다 더 심각해진 수치다. 2022년 한국의 DID는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해 회원국 중 대표적인 항생제 남용 국가로 꼽혔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카지노릴게임
되면 약물 선택이 제한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증증환자와 노령환자, 어린이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생제 남용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보건의료 과제로 꼽힌다. 내성균의 증가는 입원 기간을 늘리고 고가 항생제 사용으로 의료비를 늘려 보건경제학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동남아와 동지중해에선 관련 감염 3건재테크동호회
중 1건이 내성균 때문
2300만 건 이상의 감염질환 사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아시네토박터속균, 대장균, 폐렴막대균, 임균성 임질균,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속균, 시겔라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연쇄상구균 등 8가지 흔한 병원성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삼았다. WHO는 이 8종의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요로·혈류·위장관·비뇨생식기·임질 감염 등에 처방되는 22가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병률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은 WHO가 100개국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감시 시스템(GLASS)'에 보고된 데이터가 바탕이 됐다.
WHO는 항생제 내성 위험이 동남아시아와 동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보고된 감염 사례 3건 중 1건이 내성균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아프리카 지역에선 감염 사례 5건 중 1건이 내성균에 의한 것이었다.
중증환자 공격 그람음성균 1차항생제에 40~70% 내성
더욱 문제는 살모넬라균·이질균·티푸스균·대장균·콜레라균 등 그람음성균이다. 그람음성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증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과 요로 감염 등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료 시설·장비·인력 등의 부족으로 세균성 병원균 진단·치료 역량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그람음성균 때문에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람음성균 중 대장균과 폐렴간균은 약제 내성 그람음성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패혈증·장기부전,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세균 감염인 혈류 감염에서 발견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장균의 40% 이상과 폐렴간균의 55% 이상이 이러한 감염증의 1차 치료제인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에선 이에 대한 내성률이 70% 이상이라고 WHO는 지적했다.
1차는 물론 2차 항생제에서도 40~50% 내성
병실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와 이를 보살피는 의료진의 모습. 중증환자의 인공호흡기와 요로 등에는 그람음성균이 감염을 일으킨다.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이 위험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흔한 질환에 쓰는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의 유전자가 확산되면, 관련 감염질환을 잃는 환자에겐 더 비싸고 더 구하기 힘든 2차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2차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 때나 1차 항생제가 듣지 않을 때 쓰는 2차 광범위 항생제인 '감시(Watch) 항생제'의 내성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선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에 의한 혈류 감염의 최고 54.3%가 감시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보였다. 이 항생제는 1차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면서 사용이 늘고 있는 2차 항생제다. 동남아시아에선 폐렴간균에 의한 혈류 감염에서 카바페넴의 내성 빈도가 4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 확산 속도,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빨라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를 앞지르며 전 세계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국이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를 강화해 항생제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WHO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새 감염질환 확산이 신약 개발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몽유병 환자처럼 세계적 보건재앙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2050년까지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젠 새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대중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적절한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항생제는 약 90종이지만 다제내성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항생제는 단 5종에 불과하다.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시스템 GLASS는?
WHO에 이번 보고서 작성에 토대가 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감시 시스템(GLASS: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Use Surveillance System)'은 2016년 25개국으로 시작해 2016년 104개국까지 늘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항균제 감수성 검사(AST)'를 실시하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면서 GLASS를 통해 WHO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GLASS에 참여한 국가가 104개국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제내성균 대응에서 국가별 불평등이 상당한 셈이다.
채인택 의학 저널리스트 (tzschaeit@kormed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