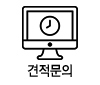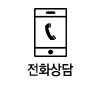“우리 때는 말이야!”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옛 흔적들 지우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 양지탕이 있다. 양지탕 건물 꼭대기에는 벽돌 굴뚝이 여전히 우뚝 솟아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수봉산 밑자락 아리마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방, ‘양지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중목욕탕으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고,
릴게임바다이야기 목욕탕이 사라진 지금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양지탕은 198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는 보일러실,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 3층은 주인집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 우뚝 솟아있는 벽돌 굴뚝을 보면 이곳이 목욕탕이었다는 걸 단박에 알수 있죠. 초창기만
야마토게임연타 해도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 북적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굴뚝에서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졌죠.
아리마을 고문이자, 동네 주민인 김영례 고문은 옛날 양지탕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온탕과 냉탕 사이
1982년 아리마을에 목욕탕 등장… 굴뚝엔 쉴새 없이 김 ‘모락’
손오공릴게임 세월 지나 쇠퇴의 길… 몇차례 주인 바뀌고 2019년 영업 중단
옛 양지탕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새단장한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사아다쿨
시간이 흐르면서 양지탕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몇 차례 주인이 바뀌고, 결국 2019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공중목욕탕은 양지탕밖에 없었던 터라, 주민들의 아쉬움은 컸습니다. 이제 더이상 아무때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사라졌기 때문이
릴게임사이트 죠. 마을 꼭대기에 있는 경로당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양지탕에 모여 일상을 보냈는데, 한순간에 갈 곳이 없어져 길가에 나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당시에 아리마을 통두레 회장을 하고 있던 김영례 고문은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옆마을 빛고을 통두레와 힘을 합쳐 양지탕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바로 빛고을 통두레 회장이었던 박영복 회장(현 아리마을 주민협의체 회장)과 힘을 합치기로 결정헀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양지탕 곳곳에는 옛 양지탕 모습이 남아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주민공간으로 새로 바뀐 양지탕 곳곳에는 여전히 옛날 양지탕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양지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미닫이 창문이 있는 은색 철제의 ‘매표소’가 나옵니다. 1층과 2층 곳곳에는 그때 썼던 샤워기, 수조, 사우나실 등도 그대롭니다. 보일러실이었던 지하에는 빨간색 고무줄 열쇠가 꽂힌 갈색 사물함이, 1층에는 냉탕이었던 구조와 깨진 타일에 시멘트를 발라 덧댄 모습까지 고스란히 간직돼 있었습니다.
양지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미닫이 창문이 있는 은색 철제의 ‘매표소’가 나온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이렇게 목욕탕이었던 양지탕을 보존했던 이유는 뭘까요. 박영복 회장은 이런 게 다 역사라고 말합니다. “옛날 양지탕 모습을 다 없애고 싶어한 주민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은 (공중목욕탕을) 잘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예전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 때는 이런 곳이 있었고 이런 걸 했다, 그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되는 거지.”
목욕탕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지탕 리모델링과 함께 신축 빌라 공사가 함께 이뤄지면서 소음이 심했죠. 그래도 이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월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탕이 문을 닫고 4년 뒤인 2023년, 양지탕은 공중목욕탕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사라졌지만 그 안의 사랑방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주민들 곁으로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는 주민들이 찾아올까 다들 걱정했다고 합니다. 걱정도 잠시, 양지탕은 아리마을에서 가장 시끄럽고 ‘핫’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이들까지 전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때 빼고 광내고
동네 사랑방 사라져 갈 곳 잃은 어르신들 길가에 앉아있곤 해
아리마을·빛고을 통두레 회장, 힘합쳐 ‘어울림공간’으로 조성
양지탕 지하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이곳을 처음 방문한 날, 마침 신나는 노랫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9월 말에 있을 동네 축제 무대에 오르기 위한 라인댄스 수강생들의 연습이 한창이었거든요. 보일러실이었던 지하층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나풀거리는 치마와 검정 블라우스를 입은 주민 8명이 신나는 노랫소리에 맞춰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박영복 회장은 장소가 좁아 더 많은 주민이 수업을 못 듣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라인댄스 수업도 지금 더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지하층)가 좁아서 8명밖에 못 해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축제 때 무대에 오른대요.”
양지탕 지하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라인댄스뿐만 아니라, 1층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과 압화 교육도 열립니다. 김영례 고문도 압화 작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압화는 생화나 꽃잎을 압화판 등으로 눌러 말린 뒤 소줏잔이나 목걸이 등에 활용하는 꽃공예를 말합니다. “이게 생화예요. 생화를 말려서 넣은 거지. 클로버도 넣고 부채도 만들고 이것도 축제 때 전시할 예정이에요.”
과거의 욕탕 위치에 농구대가 놓여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층은 아이들 놀이방인데 과거 욕탕으로 쓰였던 곳에 농구대가 놓여져 있고, 때로는 볼풀이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양지탕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특히 3층에 있는 경로당은 아리마을 어르신들이 가장 애정하는 곳입니다. 마침 어르신 스무명이 점심을 먹고 계셨습니다. 콩나물과 가지무침, 멸치볶음, 쌀밥, 미역국, 제육볶음. 딱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집밥이었습니다. 후식으로 샤인머스캣을 나눠먹고, 화투판이 열립니다. 판돈은 10원짜리, 고스톱도 아닌 민화투였습니다.
“옛날처럼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화투도 치고) 좋지.” “여기 다들 혼자야 혼자 사니까 맨날 이렇게 나와서 노는 거야.”
#주민 손때 오롯이
은색 철제매표소·썼던 샤워기·수조·사우나실 등 그대로 보존
1층은 댄스·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2층은 놀이방 등 운영
양지탕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아리마을은 ‘아리고 쓰리고 애달픈’ 마을을 뜻합니다. 김영례 고문이 직접 마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아리고 쓰린 이유는 실향민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중에도 한 어르신이 나가자, 모두 “내일 또 오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이웃의 정이 느껴집니다.
“갈 때 인사하면 좋아해. 안 하면 삐지고 나가기도 해. 여기 전부 짝꿍이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 안 나오면 웃을 일도 없고, 말할 곳도 없고, 맨날 (집에) 들어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거지.”
겉으로만 본다면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례 고문, 박영복 회장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본 양지탕은 공공사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을 향한 주민들의 애정입니다. 양지탕이 어려움에 문을 닫자, 이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사랑방으로 주민들이 살려낸 건 그 애정이 아리마을을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영례 고문은 말합니다. “양지탕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던 보물이자 겨울을 따뜻하게 해줬던 지난날의 추억이야. 지난날이 있으니, 지금도 있는 거야.”
김영례 고문과 박영복 회장의 ‘시’로 양지탕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리마을 주민들의 인사처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기자 admin@119sh.info
 http://33.cia565.com
0회 연결
http://33.cia565.com
0회 연결
 http://79.cia565.com
0회 연결
http://79.cia565.com
0회 연결